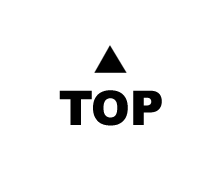수료하고 나서 깨달은 것들
우리 조는 나 말고는 전공자가 없었고, AI 프로젝트를 제대로 구현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실적인 주제로 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전 기수에서도 가장 많이 했던 자율주행이었고
결과적으로는 30%도 구현하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어차피 실패할 거 왜 좀 더 도전적인 주제로 하지 못했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선 하드웨어를 꼭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했다.
그리고 주제의 참신함이나 진정성(우리가 이 주제를 정말 하고 싶은가?)보다는
현실의 눈높이에 맞추다보니 오히려 우리의 프로젝트는 전혀 인상적이지 못한 것이 되어버렸다.
참고로 23기 AI 프로젝트 최우수상은 우리 반에서 나왔는데,
Stable Diffusion(생성 AI)를 활용한 프로젝트로 이전 기수에서는 한번도 등장하지 않던 주제였다.
게다가 하드웨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100%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였다는 점을 명심하자.
더 놀랐던 건 이 조가 최종 발표 전까지는 가장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는 점이다.
웬만하면 좋게 말해주는 게 윤은영 교수님 스타일이었지만
이 조가 발표를 하고 나면 교수님의 침묵이 길어졌다.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이 프로젝트가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지,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지 도무지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우리 입장에선 'Stable Diffusion으로 이미지에 노이즈를 입혀서 모방 방지를 한다'는 컨셉 자체가
너무 생소했고 필요성도 납득이 가질 않았던 것 같다.
그랬던 그 조가 마지막 주차가 되어서는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발표 자료가 눈에 띄게 발전하고 하나의 설득력있는 스토리 라인이 만들어진 것이다.
교수님도 마지막 리허설 발표 때는 '이제야 뭐가 보인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셨다.
나는 이게 포빅아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나름의 시사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조는 중간 발표 때마다 핍박(?)아닌 핍박을 받곤 했다.
심할 때는 '어... 저 조는 주제 다시 뒤엎어야 할 것 같은데'할 정도로 교수님의 반응이 시원찮았고
발표자나 다른 조원들도 풀이 많이 죽어보였다.
그 조 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주제로 끝까지 밀고 나가보자, 우리 주제를 믿고 발전시켜보자는 의견이 있었을 거다.
게다가 나머지 조들이 모두 열심히 하드웨어로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을 때
그 조만 하드웨어를 쓰지 않았다.
분명 하드웨어를 쓰는 게 암묵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유리하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을 텐데
아예 다른 시도를 하는 모험을 강행한 것이다.
그래서 (물론 속으론 부러웠지만) 난 그 조가 최우수상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뚝심있게 자기 주관을 밀고 나가기.
이 두 가지 태도는 꼭 간직해나가야 할 것들이다.

'회고록 > 포스코 AIㆍBig Data 아카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Part 1] 용의자의 신발을 찾아라: AI 기반 족적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기까지 겪었던 시행착오들 (1) | 2023.12.20 |
|---|---|
|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PIAI) 23기 인턴 후기 [생활 편] (2) | 2023.12.19 |
| 포스코 청년 AI Big Data 아카데미 23기 후기 10편: AI 교육에 크게 기대해선 안되는 이유 (1) | 2023.12.09 |
| 포스코 청년 AI Big Data 아카데미 23기 후기 9편: 연구 인턴 면접 후기 (0) | 2023.11.12 |
| 포스코 청년 AIㆍBig Data 아카데미 23기 후기 8편: 자소서, 면접, 채용박람회 (0) | 2023.10.05 |